|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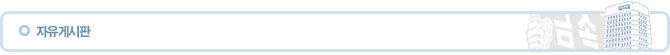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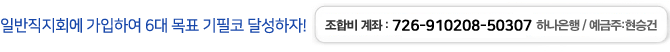 |
  |
| 올린이 :
법원 |
조회수: 1365 추천:176 |
2015-10-06 11:08:55 |
|
|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


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재판관들이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유죄 판결”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4.04.04 21:17:34
[로이슈=신종철 기자]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
인권변호사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한 윤길중 변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예의를 갖춰 사과를 하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현직 재판장이 과거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법원에 따르면 군사혁명위원회는 5ㆍ16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61년 5월 17일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공포했다.
35일 뒤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됐고, 곧바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정치ㆍ사회계 주요 인사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돼 형벌의 소급적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950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윤길중 변호사는 1961년 5월 22일 체포돼 12월 11일 이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될 때까지 204일간 구금돼 있었다.
혁명검찰부는 “윤길중 변호사가 통일사회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정권이 당시 국회 제안을 추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을 적극 반대하고 영세중립화통일론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기도하고, 실제로 1961년 2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반민주악법규탄대회를 개최하고 2대 법안을 반대하는 선전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했다.
혁명재판소는 1962년 2월 14일 윤길중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상소했으나, 1962년 4월 27일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에서 상소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혁명재판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길중 변호사는 복역하다가 1968년 4월 20일 석방됐다. 처음 체포돼 석방될 때까지 2526일, 약 6년 11개월을 복역한 셈이다. 그해 이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기도 했으나, 1975년 변호사자격을 회복했다.
석방됐으나 정치활동을 금지 당했던 윤길중 변호사는 1970년 신민당에 입당해 이듬해 제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80년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위원이 되고, 그해 12월 민주정의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후 1981년부터 1992년까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1~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윤길중 의원은 국회부의장과 1990년 민주자유당 상임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07년 7월 별세했다.
윤길중 전 의원의 손녀가 2011년 5월 할아버지의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2년 10월 “망인이 구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30일을 초과해 204일 동안 구금됐으므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형법의 불법체포ㆍ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윤길중 변호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3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윤길중 변호사의 유족들은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망인의 수감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가족에게 총 49억1054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3월28일 “국가는 재심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5억5600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가합538060)
특히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눈길이 끌기에 충분했다.
재판부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법인 헌법에 비춰 그 뜻을 해석하고 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이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법원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이 특별법이 무려 3년 6개월을 소급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합헌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용해 망인에게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ㆍ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5ㆍ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과거 재판관들을 질타했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특수성과 불법의 중대함 ▲망인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은 중형이었고, 약 6년 11개월 동안 수감됐던 점 ▲체포와 수감으로 가족들이 신분상, 경제상의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은 점 ▲이 사건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가해자가 돼 발생했고, 그럼에도 국가는 오랜 기간 망인과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윤길중 망인에게는 위자료 7억원, 처에게는 2억원, 구금됐을 때 태어난 장녀에게는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자녀에게는 각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로이슈 >
|
|
|
|
|
|
![]()
 추천하기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