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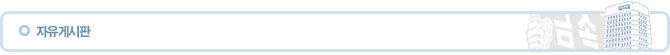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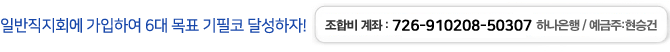 |
  |
| 올린이 :
계몽주의 |
조회수: 971 추천:176 |
2016-01-24 19:41:10 |
|
| 간행언청 |


맹자(孟子)는 제나라 선(宣)왕이 "예(禮)에는 섬기던 임금이 죽으면 상복을 입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상복을 입게 되겠는가?"고 물었을 때 "신하가 간하면 행하고 말하면 들어(諫行言聽)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신하가 떠나면 국경까지 인도해 주고,3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야 주었던 땅과 집을 회수하는,세 가지 예를 지킨다면 상복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신하가 간해도 행하지 않으며 말해도 듣지 않고,떠나면 찾아가서 체포하고, 떠나는 날 주었던 땅과 집을 회수해 버리니 원수가 되는데 원수를 위해 무슨 복을 입겠습니까?"(요약)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한글을 창제한 성군 세종 때의 재상 허조(許稠)는 경암문집(敬庵文集)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돌이켜보면 때로 역린(逆鱗,임금의 분노)을 자초하면서까지 주상의 뜻에 반대한 적도 많았다.
모두들 가(可)하다고 하는데도 내가 고집할 때면 상께서는 "허조는 고집불통이야"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셨다.
하지만 상께서는 늘 끝까지 내 의견을 경청하셨고,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그 정책을 시행하셨다.
그야말로 간하면 행하시고,말하면 들어주셨다(諫行言聽)."
성경에서 현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부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능히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여 얻었는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직역하면 '듣는다(hear)'는 뜻이라고 한다.
듣는다는 말은 승낙한다거나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도 쓰이니 지혜와 통한다.
자기 말만 하면서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말귀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언청간행'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단순히 '언청'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간행'까지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럴진대 반대자의 말을 '언청간행'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 일들을 보면 모두 '언청간행'을 하지 않아 일어난 일들이다.
|
|
|
|
|
|
![]()
 추천하기
추천하기
|
|